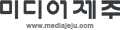박현정씨는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서울 강남 출신이다. 서울 토박이인 그는 대기업에서 식품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소위 ‘잘 나가는’ 이였다. 그런데 그는 제주에 아예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 흙도 한 번 만져보지 않은 그는 모루농장을 일구는 농군으로 변신했다. 왜 그는 변신을 했을까. 그보다 왜 강남을 던지고, 제주로 왔을까. 궁금증이 촉발된다. 제주정착 3년차인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은 애들 학교 때문이죠. 우연히 제주도를 왔다가 이거다 싶었죠. 제주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좋든 나쁘든 전염 속도가 느리죠. 여긴 교사들이 헌신적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공교육이 살아 있어요. 친환경급식도 유일하잖아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선택한 땅이 제주였다. 그가 보기엔 제주도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다. 그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점이 오히려 좋다며 ‘소외된 게 축복’이라고 한다. ‘소외된 축복’을 느끼면서 생각대로 산다는 점은 좋다. 그래도 일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농업이었다.
“제주에 와서 훑어보니 주산업은 농업이더군요. 농업은 특별한 산업이 될 수 있고, 환경을 지키면서 국토개발도 할 수 있어요. 이를 더 발전시키면 농업관광도 되거든요. 남들에게 휴양까지 겸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농업이죠.”
그는 농업을 향해 자연을 망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는 100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찾는다는 점에 눈길을 준다.
“제주 농업은 관광객을 겨냥한 ‘제주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명의 관광객을 엉뚱한 리조트나 지중해식 호텔에 뺐기고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산업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는 제주에서 처음 시작한 농사가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다. 그가 자신감을 갖는 건 이유가 있다. 그는 모루농장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모루농장은 유기농에 주안점을 둔다. 모루농장의 주요 산물은 ‘차(茶)’다. 감귤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농부 박현정씨는 모루농장만 일구는 게 아니다. 한 가게를 인수, 여기에 새로움을 담았다. 그가 내건 가게 이름은 ‘동네가게’다. 동네가게는 지금종 조랑말박물관장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이름이 ‘동네가게’여서인지 어린이들의 발길이 잦다. 기자가 박현정 대표를 만난 곳은 바로 ‘동네가게’였다. 취재내내 어린이들이 들락날락하며 차를 주문하고 마신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가시리만의 풍경이다.


제주정착 3년째인 그는 모루농장을 일구고, 동네가게를 오픈하며 지역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제주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데 여기는 제주만의 로컬 스탠다드가 있어요. 처음엔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젠 오히려 로컬 스탠다드를 더 지키고 살라고 말해요. 제주에 온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왔잖아요. 제주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 모임에 나가면 제주에 대한 이런저런 불평을 듣곤 해요. 이젠 제가 그 불평이 불편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제주사람들에게 흔히 붙어다니는 ‘배타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제주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요? 아니에요. 배타는 나쁜 단어가 아니랍니다. 좀 더 자신 있게 배타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좀 더 마음을 열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